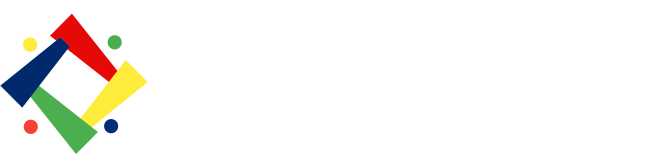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곁에 있어서 오히려 존재를 거의 잊다시피 살아가는 공기만큼은 아닐지라도,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도 그 존재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국어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한 해를 한 달 남겨 놓은 이 자리가 ‘나의 국어생활은 어떠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국어 전문가로서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지만 가끔 맥이 좀 빠지는 일도 겪게 된다. 그런 일 중 하나가 맞춤법이나 문법을 소홀히, 적당히 생각하는 태도를 만나는 것이다. 계도하거나 훈계를 하려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알기 때문이다.
문서 작성 강의를 다니다 보면, 아래 (1)과 같이 ‘쌍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단어인 ‘일시, 장소’의 띄어쓰기를 조정하여 위치를 맞추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도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특히, 포스터나 현수막같이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적 문서 같은 경우에서는 (2)와 같이 맞춤법에 따라, 즉 한 단어는 붙이고 각 단어는 띈다고 하는, 단순하고도 편리한 기준에 따라 쓰면 저러한 위치 조정은 사실상 필요치는 않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고도 하고,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요구해서라고도 하지만... 맞춤법에 대한 이해나, 이를 지키려는 마음은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1)
일 시:
장 소:
참석자:
↓
(2)
일시:
장소:
참석자:
위와 같은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맞춤법에 따른 표기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만난다. 대개 참고 문헌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맞춤법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 문헌부터 어문 규범에 따른 표기 표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해야겠지만 이 역시 아쉬움이 크다.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단춧구멍’일지라도 참고 문헌에 ‘단추구멍’으로 되어 있어 ‘단춧구멍’으로 쓸 수 없다고 하거나, 영어와 프랑스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아 ‘찌’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치’로 써야 한다고 하여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을 겪게 될 때 ‘나의 언어생활’의 존재감을 인지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국어생활 맥락에서 규범이나 문법을 엄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직된 태도라고 하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국어의 규범이나 문법을 알고자 하고 이에 따라 국어생활을 하고자 하는 태도는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삶을 살아오면서 ‘태도’가 ‘방향’을 결정짓는 직간접의 경험을 많이 했다. 국어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태도가 ‘나의 국어생활’의 방향 그리고 질을 결정짓는다. 그런 점에서 2025년 한 해 자신의 국어생활을 돌아보며, 먼저는 내가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규범이나 문법에 관심을 두었나, 또 그 존재를 인식하며 그에 따라 쓰고자, 말하고자 했나를 생각해 보는 12월이 되면 좋겠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에는 누구나 뒤를 돌아보고 앞을 가늠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이 다짐 속에 ‘이전보다 더 나은, 나의 국어생활’을 위한 다짐도 끼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 이수연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상담연구원)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