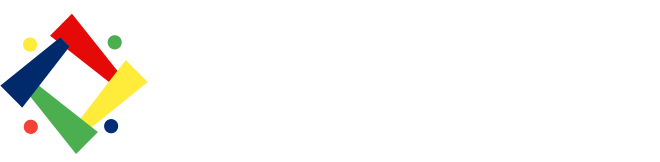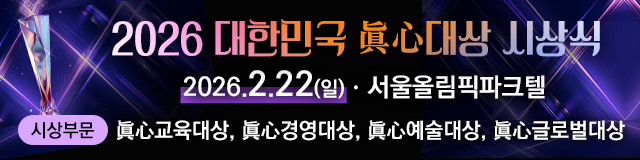‘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면 우리는 로마의 귀족들을 떠올리게 된다. 로마의 귀족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에 못지않은 헌신을 했기 때문이다. 사재를 털어 거리 및 사회 공공시설을 세웠고 전쟁이 발발하면 귀족들과 그들의 자제들은 진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고 많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원래 노블리스(Noblesse)는 '닭의 벼슬'을 의미하고 오블리제(oblige)는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는 말이란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말로 사회로 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리스)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무려 백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을 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백년전쟁이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칼레'라는 작은 항구도시가 있는데 인구 12만인 이 항구는 영국의 도버 해협과 불과 20여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영국과 프랑스 파리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하게 되고 칼레 시민들은 끝까지 영국에 저항했으나 구원군이 오지 않아 1347년 끝내 항복을 하게 된다. 그러자 영국에 너무나 끈질긴 저항을 했던 칼레를 쉽게 용서하지 못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 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여섯 명이 처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칼레에서 제일 부자인 `외스타슈드 생 피에르'가 선뜻 나섰고 뒤를 이어 시장인 `장데르’가 나섰고, 부자 상인인 `피에르 드 위쌍'도 나섰다. 게다가 `드 위쌍'의 사촌마저 위대한 정신을 따르겠다며 나서는 바람에 이에 감격한 시민 세 명이 또 나타나 한 명이 더 많은 일곱 명이 되었다. 그러자 `외스타슈드'는 제비를 뽑으면 인간인 이상 행운을 바라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처형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빼자고 제의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여섯 명이 처형장에 모였을 때 정작 `외스타슈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정을 알아보니 처형을 자원한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먼저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이에 태아를 잉태하고 있던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하여 `에드워드 3세'에게 용감한 칼레시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애원하였고 왕은 왕비의 소원을 받아들여 처형을 취소하였다.
그 후 칼레는 노블레스(귀족) 오블리주(의무)라는 단어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 칼레시의 요청으로 로댕이 10년의 작업 끝에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조각품을 만들게 되었다. 목에 밧줄을 걸고 처형장으로 나가는 6명의 장엄한 모습에 로뎅의 숨결이 더해져서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 작품은 불후의 명작으로 칼레 시청 앞에 서 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는 귀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1440년에 설립되었으니 60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자신만 아는 엘리트의 입학은 원하지 않는다. 이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고 천명한다. 실제 이 학교 학생 출신들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2,000명이나 죽었다. 전시 중 어떤 때에는 전교생의 70%가 참전해서 죽기도 했다.
오늘날 신분제를 뜻하는 ‘귀족’이라는 단어는 빛이 바랬으나 사회 지도층은 여전히 있다.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도층에게 희생을 바라지는 못할지언정 병역 기피, 세금 포탈, 각종 위법으로 인사 청문회가 얼룩지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 최홍석 칼럼니스트
최홍석
전남대학교 국문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서울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호남삼육고등학교 교감 및 교장 정년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