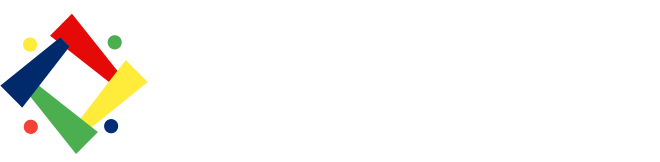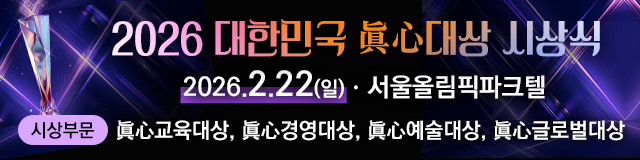넌 사랑 그 자체야
“엄마, 할매가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아이의 꾹꾹 누른듯한 목소리. 이미 두 눈엔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래, 많이 참았다 싶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손녀로 할머니에게 기쁨의 존재였던 우리 아이. 그 사랑에 답하듯 손녀는 지난여름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까지 지치지 않고 지극한 사랑을 보냈다. 아이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행여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지워질까 슬퍼하고 있었다.
“○○야, 네가 할머니와 한 일을 다 기억하든 못하든 너는 할머니한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 줬어.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엄마도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너만큼 순수하지는 못했을 거야. 너는 어떠한 이익이나 요구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이었어. 사랑 그 자체였다고 생각해.”
나는 눈물 콧물로 젖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넌 사랑 그 자체”라고.
레스터 레븐슨은 <세도나 마음혁명>에서 행복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그런 손녀를 향한 애틋한 손길 속에 오고 갔을 교감과 사랑의 언어를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 않을까. 함께하는 그 순간마다 두 사람은 행복 안에 머물렀으리라 감히 단언해 본다. 어쩌면 내가 짐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행복이었다. <중략>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했다.” - 세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븐슨, 헤일 도스킨
내 안에도 저런 사랑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다 보면 받고 싶고, 받으면 부족한 것 같아 그 무게를 저울질한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다.
과연 언제쯤 사랑의 저울질을 멈출 수 있을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흔한 말이 있다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인정하기가 산 하나를 옮기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사랑도 행복도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단지 눈을 감고 찾지 않고 있을 뿐이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알면서도 그냥 산다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살던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게 사람이다, 하지만 살던 대로 살아서 불편하고, 매일 내가 맺는 관계가 해결할 숙제로 느껴진다면 변화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이리라. 어느 날 내게 번뜩이는 섬광처럼 깨달음이 온 것처럼 말이다.
나는 지금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를 관찰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미련과 불편함에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겨우 이 정도의 그릇으로 살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쩌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행했던 할머니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으로써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생각한다. 내게도 사랑이 기쁨과 환희로 다가오고 있음을.

김연희 작가는
글 쓰는 순간이 행복해서 계속 씁니다. 마음과 영혼을 이어주는 글을 통해 의식 성장을 하며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가로 살아갑니다.
브런치 작가로 활동 중이며,저서로는 <치유글약방> 2023, <성장글쓰기> 2024
[대한민국교육신문]